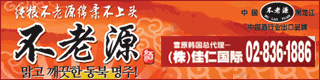| |  |
| | 지난 설 무렵 만주 길림성의 양병진에 있는 중국동포 마을인 고수촌을 부산문인들과 함께 방문했다. 왼쪽부터 필자, 그 곳 마을에 사는 김일량 시인, 서규정 시인, 박명호 소설가. |
|
날이 점점 추워 온다. 한랭 고기압이 먼 산등성이의 스카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려 보인다.
올 겨울에는 또 얼마만큼의 눈이 올까. 겨울이 다가오면 언제나 눈 내리던 산골의 유년이 그리워진다. 눈의 무게를 못 이겨 툭툭 부러지던 소나무 가지들. 그 속에서 사냥개 데리고 산토끼 쫓던 즐거운 달음박질. 신발은 눈에 푹푹 빠지고, 옷을 껴입은 몸이 자꾸 넘어지곤 했다. 눈이 아니라면 어떻게 겨울의 진미를 재생할 수 있을까.
동남쪽 항구의 겨울은 눈에 인색하다. 우리의 기대를 번번이 저버린다. 대륙 쪽의 눈보라가 산맥을 넘어오다가도 그 여운을 쉽게 거두어 버린다. 눈의 깊이에 묻히고자 하는 이는 먼 북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눈이 많고, 민족의 신화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득한 평원의 끝까지 눈부신 설국이다.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풍경을 가슴에 품고 산다.
지난 설 무렵, 눈이 그리워서 만주의 길림성에 갔었다. 그곳 양병진에는 '고수촌'이라는 중국동포 마을이 있고, 거기에 한 시인이 살고 있었다. 연길에 사는 어느 문인의 소개로 그 마을에 찾아갔을 때 세상은 온통 눈뿐이었다. 마을 앞의 너른 들판이 은빛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눈에 사무친 회포를 마음껏 풀 수 있을 듯했다.
나무울타리 안의 시인을 찾았다. 주인은 수수한 모습으로 일행을 맞았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생각보다 크고 억세었다. 대지에 뿌리내린 그는 농사짓듯 시를 쓴다고 했다. 연변 조선족 문단에 꽤 알려진 그의 이름은 김일량.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을 줄곧 지키며 살아왔다고 했다.
시인의 집은 초가였다. 오른쪽 외양간 마당에는 실한 소가 두 마리 서 있었다. 남쪽 지방과 달리 소들이 외양간 바깥의 눈밭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특이했다. 살림채 마당으로 들어서자 닭들이 먼저 반겼다. 닭들 역시 마당의 눈밭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람과 가축이 혹한에 잘 적응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집의 내부 공간은 부엌과 방 두 칸. 벽도 없이 터져 있었다. 얼핏 보기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살림 도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아늑한 온기가 몸을 녹여 주었다. 집 안에서만 겨울 석 달을 나도 충분할 듯싶었다. 이내 부인이 일행을 위해 술상을 봐 왔다. 닭찜과 두부, 천엽 등이 주된 안주였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일행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나는 농사일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주는 만큼만 거두어들이면 됩니다. 시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연이 빚어내는 이야기를 받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술이 한 순배 돌고 난 다음에 김일량 시인은 자신의 시론을 이렇게 말했다. 이른 아침 풀잎의 이슬을 보면 이슬을 노래하고, 절기가 바뀌어 서늘한 바람이 불면 바람을 읊는 것이 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열되고 뒤틀린 도시적 언어와 이미지를 비판했다. 시는 농사만큼이나 소박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아직 자본주의의 욕망 구조에 편입되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 생태적 삶의 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어지간히 포만감을 느낀 일행은 마을 구경에 나섰다. 마을 한복판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터줏대감처럼 서 있었다. 기세가 왕성해 두꺼운 나무껍데기들이 공룡의 발톱을 연상시켰다. 마을의 안쪽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속에는 김일량 시인의 외아들 용이도 섞여 있었다. 일행은 시인의 안내로 눈 덮인 들길을 걸어 이웃마을까지 한 바퀴 둘러보았다. 눈길을 성큼성큼 앞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대지 위에서 시를 경작하는 한 인간의 진면목을 부각시켰다.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