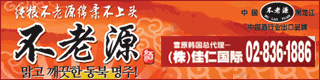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 땅에 묻는 것은 토장(土葬), 불에 태우는 것은 화장(火葬), 그리고 물에 띄우는 것은 수장(水葬)이다. 1996년 에 나는 "성중애마"(1998년, 연변문학)를 집필하면서 중국 서장자치구(西藏藏族自治區, 티벳)에 갔다가, 그 지방의 깊은 산간들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죽으면, 시체의 내장을 끄집어내어 까마귀에게 먹이는 것을 본적이 있다.
까마귀는 그 지방 종족의 토템(totem)이라서, 만약 까마귀가 그 내장들을 물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죽은 사람도 같이 승천(昇天)했다고 그네들은 나팔을 불면서 좋아하는것이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장(天葬)이라고도 한다는데, 오늘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천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번은 한국 용인대학의 한 친구가 자기 소꿉시절의 동무라면서 부산의 한 동무, 그리고 마산에서 한 동무, 또 그리고 전주에서 한 동무, 이렇게 세동무를 데리고 연변에로 나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다. 그중 마산에서 왔다는 동무는 거쿨지고 깡패같이 생긴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인데, 우리 조선족 불법체류자 10여명을 일군으로 쓰고 있다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우리에게 "부마사태"라는 사건이 있는거 아시지오? 부마(釜馬)란 부산과 마산을 하는 말입니다. 독재와 맞다들어 싸운 투사들이 우리 마산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성깔 사나운 사람들이 많지오. 대부분이 영웅호걸들이지오."
그러면서 자긴 별명이 이장군인데, 마산에 와서 이름자 이태문(李太文, 假名)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이장군이라면 다 안다는것이었다. 그래 나는 이장군과 친하기로 맘 먹고 같이 연변지방을 구경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회령시를 바라볼수 있는 용정시 삼합진(三合鎭)에 갔다왔는데, 길에 그렇게 까마귀가 많이 나는 것을 본 이장군은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덥썩 나의 손을 잡고, "청설선생, 까마귀 한 마리만 꼭 잡아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돈은 얼마던지 내리다. "고 간절하게 청하는것이었다. 아마 한국에는 까마귀가 없나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장군의 소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까마귀 한 마리 2, 30만원 한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웃으면서 "까마귀 고기 무슨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잊음이 헤퍼진다구 들었는데요, 서장 같은 지방에서는 까마귀가 그 종족의 토템이라서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일 납니다. 관두십시오."하고 말렸는데, 이장군은 차를 멈춰세우고 머리 맡에서 낮게 날아 다니는 까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돌멩이질을 해댔다. 그랬어도 우린 그가 설마하니 돌멩이로 까마귀를 떨궈내려나 미심했는데, 그는 정말 돌멩이로 까마귀를 떨궈내서는 잡아 목을 비틀며,
"까마귀 고기같이 사람 몸에 좋은 고기도 드물답니다. 중국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달나라에 올라간 상아(常娥)도 남편이 잡아오는 까마귀고기를 많이 먹었더군요, 토템이면 뭐랍니까! 중국 노(魯)나라 때, 주나라(周族)사람들의 토템인 기린도 사냥꾼들이 많이 잡아서 팔아먹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곰은 우리 한국인의 토템입니다. 어떻습니까? 잡아서 웅담도 빼내고 하지않습니까! 그리구 그 곰발(熊掌)은 또 얼마나 좋은 요리인데요..."
[금할 금(禁)에, 꺼릴 기(忌)]
실은 나도 그때 처음 까마귀 고기가 정말 듣던 소문대로 새까만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까마귀를 잡은, 까마귀와 꼭 같은 짐승이면서도, 고급(동물)짐승으로써, 사회적인 군체(群體)인 우리 인간의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반드시 그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것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금기"라는 것을 중국 글로 금할 금(禁), 꺼릴 기(忌)로 쓴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써 이 금기를 깬다는 것은 당연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꺼리는 짓을 하게 되면, 그 인간은 따돌림당하게 된다는 것은 물어보나마나한 일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는 “금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무형(無形)의 법률로서 신에 대한 관념이나 어떤 종교 신앙의 발생보다도 훨씬 앞선다”고 주장했었다. 즉 인간이면서 스스로 인간정신의 금기를 깬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상관 없이 그 사회의 법 같은 것을 떠나서 인간 본연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근본을 버림으로써,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하의 짐승이 되는 것을 자초하는것이나 무슨 다를바 있겠는가!
[임금체불문제]
나는 10여차례나 한국에 다녀오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조선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 인간본연의 정신적인 "금기"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슬프다. 그리고 슬프다 못해 원통하다.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것이, 전 세계에 어데고 없는데가 없는 우리 조선족들이 유독 자기 고국이오, 조국인 한국에서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느 한 사람도 뼈 빠지도록 일을 하고 제 날자에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천이면 천명, 만이면 만명 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얼마전(2004년 5월28일-6월9일)에 또 한번 한국에 다녀오면서 나는 마산에 들려서, 그 "까마귀장군"과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거기서도 보니 역시 우리 조선족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날자에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많이 밀려서 거의 1, 2년째 한푼도 받지못한채로, 거기에 목매여서 어데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수 있는지가 참으로 의문스럽지 않을수가 없었다.
오로지 고국이오, 조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어데고 우리 조선족이 일해주고 돈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한번도 없다.
지금은 미국 뉴욕에만도 우리 조선족이 이제는 만명선을 돌파하고 있다는데, 나는 그들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한테서라도 일해주고 돈 못받았다는 소리를 딱 한번은 듣고 싶은데, 만나는 조선족들마다 붙잡고, "혹시 일해주고 돈 못받았던 적이라도 있습니까?"고 물으면,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임금 떼먹는 못된 사장을 한번 만나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뜸 법에 소송해서 몇십배, 몇백배 받아낼테니까요."하면서 의기양양해 한다.
미국의 경우 임금체불은 노동법에 의한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소송을 당한 업주가 이겨본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 또한 어마어마한 소송비도 전부 진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오히려 일해주고 돈 못 받은 노동자들을 만나면 돈 벌 일이 생겼다고 좋아한다. 그리고 그 노동자의 편을 들어 돈 가진 부자를 혼뜨검내면 그 판사도 따라서 같이 이름나게 된다. 때문에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자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면, 업주는 오로지 눈 감고 돈을 더 내주더라도 일단 노동자를 얼려서 타협을 보는 길밖에 없는것이다.
그토록 임금체불과 관련한 미국의 법도 무섭지만, 이제는 남을 일 시켜먹고 노임을 안준다는 것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에서 상상할수도 없는 일로 되었다. 즉 법을 떠나서 인간최저의 정신적인 "금기"로 간주되어 온다. 그리고 누가 그 금기를 깰 때에, 그 금기를 깬자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는 안될 짓을 한다!]
그리고 그 "금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수년전 두만강가의 삼합진으로 가는 길에서 주먹같은 돌멩이를 날려 까마귀를 잡던 한국 마산출신의 그 "까마귀장군"을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까마귀장군"의 말씀대로, 까마귀고기는 달나라의 상아도 먹었다니까, 그리고 한국인은 자기민족의 "토템"인 곰도 잡아먹는다니까, 일단 따위 정신적인 "금기"같은 것은 운운하지도 말자. 변호사출신의 대통령과 변호사출신의 법무장관을 둔 한국에서 우선 법이라도 지키자는 것이다. 일 시켜먹고 돈 안주는 놈들 잡아들이지 않는 한국 법은, 그야말로 전세계 어데도 없는 희한한 법이다. 그리고 그런 놈들이 활개치는 한국 세상은 또 무슨 세상인지? 그리고 그 "까마귀장군"은 오늘도 잘 지내는지? 계속 우리 조선족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있는지?...(2004. 6,19. 뉴욕에서.)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